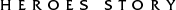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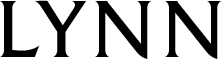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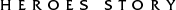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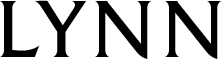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 언니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언니는 비녀를 꽂아 마무리하며 분주히 움직이던 손길을 멈추고는 나에게 물었다.
"어때?"
"예뻐! 세상에서 제일!"
언니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언니의 하얀 피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났다.

난 어렸을 적 몸이 약했던 탓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종종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엄마가 나에게 창술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그 이야기가 엄마의 귀에까지 들어간 날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건강하다 못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고만 치고 다니는 나를 보고는
엄마는 자기 탓에 내가 칠칠치 못한 딸이 되었다며 두고두고 자신을 탓하곤 했었다.
-
언니는 종종 예쁘게 단장하고는 나의 창술 연습에 구경 오곤 했었다.
날 가르쳐 주던 사람은 당시에 기병 단장의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창술 선생이라곤 하지만 실은 언니보다 겨우 한두 살 많은, 아직은 앳된 청년이었다.
난 언니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짓는 미소가 좋았다. 그 사람이 언니를 보며 지어 보이는 웃음도 좋았다.
다른 이들이 그 둘을 바라보며 말하던 "잘 어울린다는" 말도 듣기 좋았다.
그래서 난 그 둘이 잘 되길 빌었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었다.

언니가 시집을 가던 날,
언니는 더 이상 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만큼을 울고도 또 울었다.
"언니, 그냥 도망가면 안 돼?"
나의 말에 언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 가끔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거란다."
-
언니는 그렇게 시집을 갔다.
지금은 간신히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우리 왕국과는 달리 그곳은 강대국이라고 했다.
우리보다 몇십 배나 더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고,
우리보다 몇십 배나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언니가 시집을 가야 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몇 배나 더 많았다.
비단으로 지어진 거포를 두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를 마친 언니는
떠나기 전에 날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주었다.
어째서 웃는 거야. 언니.
어째서.

언니가 다시 성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였다.
폐병에 걸려서 돌아온 언니는 뺨이 홀쭉해져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언니는 숨을 거뒀다.
마지막까지 언니의 손을 붙잡고 있어주었던 나의 창술 선생은 언니의 장례식 날 오지 않았었다.
그날 그를 봤던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성 뒤편 언덕에 서서 하염없이 동쪽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모습을 감추었다.
-
소식은 사신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빌면 괜찮을 거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날 거라고도 했다.
젊은 창기병 하나가 홀로 저지른 일이니, 그자만 처형하면 괜찮을 거라고도 했다.
무언가 공물을 바쳐야 할 거라는 소문도 돌았다.
무수히 많은 소문이 오갔지만, 엄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동쪽에서 사신이 도착할 때까지.
엄마를 마주한 사신은,
얼굴만큼이나 듣기 고역인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같이할 수 없었던 나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벽을 통해 간간이 들려오던 목소리는
단독 행동이라고는 하나, 이 나라의 기병단장이 왕의 암살을 기도했으니 이는 명백한 반역행위라고 했었다.
얼마 살지 못한 약한 신부를 보낸 것 또한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넓으신 아량을 지닌 왕께서, 다른 신부를 보낸다면 특별히 용서해 주겠노라는 말을 했다고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을 두고 먼저 떠난 아빠가 원망스러웠다고 했다.
짙게 깔린 먹구름이 금방이라도 비를 퍼부을 것 같은 날이었다.
그날, 칼을 든 엄마는 가장 먼저 나의 방을 찾아왔다.

엄마의 칼날이 나의 목을 긋고, 나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졌을 때,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공주였던 내 딸은 오늘 죽었다.
그러니 백성들이 떠날 때 같이 떠나거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뒤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다.
날 안아주지도 작별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다.
하지만 방을 나가며 했었던 엄마의 마지막 말은 기억하고 있다.
"낙화를 가르쳐 두길... 잘했구나."
-
그 뒤 엄마는 성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을 대피시켰다.
얼마 남아있지 않던, 왕국의 마지막 백성들이었다.
머리가 짧아진 나는 그들과 함께 성을 떠났다.
멀리서, 동쪽에서 오고 있다는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건
잘렸던 나의 머리카락이 다시 본래대로 길었을 즈음이었다.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모아야 한다.
나의 군대를 찾기 위해.
그리고 나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내 이름은 린.
잃어버린 왕국, 유연국의 공주이다.

타닥타닥..
모닥불에 마른 장작이 타들어 가며 반짝 불꽃을 피웠다.
남자는 옆에 모아둔 나뭇가지를 불에 던져 넣으며 물었다.
"그래서, 너 같은 꼬맹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아저씨야말로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아저... 아저씨라니! 난 아직 스무 살 밖에 안됐어. 오빠라고 부르라고."
"흥, 나도 꼬맹이 아니거든?"
"당찬 꼬맹이네?"
"꼬맹이 아니라니까?"
"아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꼬마 아가씨.
마족이 득실거리는 이런 곳에 왜 너 같은 꼬마 아가씨가 있는 거지?
이런 곳은 너 같은 꼬마가... 게다가 여자애가 있는 법한 곳은 아닌데 말이지."
"흥, 내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먼저 이야기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재미있는 꼬맹이일세?"
"꼬맹이 아니라니까!"
"하하, 좋아 좋아. 음... 난 말이지, 왕국 기사단에 들어가려고 여행 중이야."
"... 왕국 기사단?"
"응."
"... 그럼 로체스트에 가면 되잖아?"
"그야 가 봤지. 하지만 나 같은 어중이떠중이를 받아줄 만큼 만만하진 않더라고."
"... 그래서?"
"그래서 알아봤더니 콜헨에 칼브람 용병단이라는 곳이 있는 모양이야.
용병단에서 공을 쌓으면 로체스트에 갈 수 있다니까... 그곳에 한번 가보려고 해."
"... 콜헨이라..."
"자, 그럼 내 이야기는 이쯤이면 된 것 같은데... 이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건 어때?"
"...난 강한 사람을 찾고 있어."
"강한 사람? 왜?"
"되찾아야 할 게 있거든."
"그래? 그럼 난 어때? 이래 봬도 나 꽤 강한데"
남자의 말에 소녀는 피식 웃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 난 이만 가볼게."
"어? 어어, 그래. 조심하라고."
"고마웠어. 오빠."
"하하하. 고맙다."
"참"
짐을 챙겨 들고 발걸음을 옮기던 소녀가 멈춰 서더니 말을 이었다.
"난 린이라고 해. 오빤 이름이 뭐야?"
"린? 그게 네 이름이야? 난 리시타야."
"그럼 리시타 오빠. 다음에 또 봐. 오빠 말대로 오빠가 강하다면,
분명 다시 만날 테니까."
"하하, 그래. 또 보자."
리시타는 웃으며 린에게 손을 흔들었다.
푸드득
날이 밝기 시작한 숲 속에 부지런한 새들의 날갯짓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글 : 멜진느 / 그림 : Rose